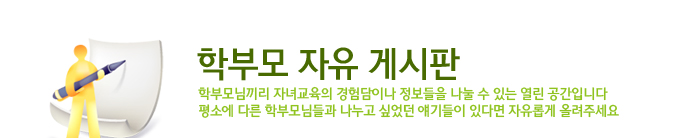부족함과 모자람의 축복-오한숙희 여성학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닥터필로스 작성일18-04-21 10:30 조회8,52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사고로 발을 다쳐 두 달 반 동안 깁스를 했었다. 깁스를 푸는 날, 골다공증이 심하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적잖은 충격을 받았
다. 운전면허가 없는 덕에 다리 힘 하나만은 장담하는 바였는데 고작 두 달 반 사이에 골다공증이라니. 탓할 대상도 없이 야속
하기만 했다. 부지런히 걷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굳은 재활의 결심을 했지만 굳어버린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을 일으
켜 발을 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러웠다. 내 하소연에 물리치료사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부지런히 두드리라면서 이렇게
말해주었다.
“다리를 안 쓰고 가만 놔두니까 영양공급이 오질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앉아서라도 마사지나 안마로 자극을 주세요. 그러
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영양분이 오게 되지요.” 우리 몸은 냉정하게도 활동하지 않는 신체부위에는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
이었다. 학생 때 생물시간에 외웠던 용불용설(안 쓰는 신체기관은 퇴화된다는 이론)의 정확함에 무릎을 칠 수밖에.
그러나 사고의 후유증은 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걷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다리근육도 많이 되돌아올 무렵 나타난 후
유증은 자식농사의 이상기후였다. 입원으로 인한 어미의 부재기간이 아이에게는 해방공간이었다. 엄마에게 사후 승인을 받겠
다는 단서를 달고 할머니 대행체제의 틈새를 횡행했다. 가불해 간 용돈은 요상스러운 옷들로 쌓여 있었고 고무줄이 되어버린
귀가 시간과 외출시간은 지저분한 방과 열혈 자유주의자의 불안한 눈빛을 만들어 냈다.
반성은커녕 자신의 개성이라고 합리화하며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사춘기적 저항정신 앞에서 나는 아연했다. 이건 골다공증
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엄청난 공백이었다. 뼈의 공백은 다리를 쓸수록 메워지건만 자식의 공백은 노력할수록 오히려 커져만
갔다. 그 무렵 거실에서 키우던 나무 한 그루가 죽어나갔다. 공교롭게도 그 나무는 재작년에 아이의 생일 선물로 내가 사 준 것
이었다. 제 키보다 더 큰 나무에 감탄하는 아이에게 나는 ‘이 나무가 곧 너라는 생각으로 잘 길러라.’라고 말했었다.
큰 나무가 남긴 거실의 공백은 설쇠고 마을 온 이웃집 할머니의 눈에도 확연했다. 그렇잖아도 쓰린 가슴을 애써 달래던 어머니
가 예의 자위적 발언을 펼치셨다.“오래 전부터 비실비실 하더라고. 갑자기 죽은 게 아니니까 수명이 고만큼 인가 보다 받아들
여야지.” “에이구, 물 많이 줬구먼. 처음 비실거릴 때 물을 딱 끊어서 바짝 말리지 그랬어.” “비실거리니까 물이 모자라 그런가
하고 또 줬지.” “모자라면 지들이 알아서 아껴 쓴다고. 넘칠 때가 문제야. 주체를 못하니까.”
이 말에 내 정신이 버쩍 들었다. 나무가 죽은 원인, 어쩐지 거기에 아이의 공백을 채우는 열쇠가 있을 것만 같다고 여겼던 마음
에 ‘넘칠 때가 문제’라는 말이 꽂힌 것이다. 인생선배들의 말대로 사춘기의 시한부 시대정신일 뿐이라고 애써 믿으면서 그럴수
록 아이에게 관대하게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왔음을 명료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쓰지 않으면 퇴화되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생명의 자연이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를 배우게 되었다. 가능하면 몸을 쓰지 않도록 하는 편의주의 시대는 내 몸을 퇴화시키고, 맘만 먹으면 쏟아 부을 수 있는 물질
풍요의 시대는 자식농사를 망친다. 자연을 착취하고 오염시키면서 만들어내는 몸의 안락과 물질적 풍요는 결국은 인간에게 재
앙이 된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서 나온다니, 생명체의 신비는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
자료출처 : 서울신문, 2005년 2월 21일
다. 운전면허가 없는 덕에 다리 힘 하나만은 장담하는 바였는데 고작 두 달 반 사이에 골다공증이라니. 탓할 대상도 없이 야속
하기만 했다. 부지런히 걷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굳은 재활의 결심을 했지만 굳어버린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심한 통증을 일으
켜 발을 딛는다는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러웠다. 내 하소연에 물리치료사는 허벅지와 종아리를 부지런히 두드리라면서 이렇게
말해주었다.
“다리를 안 쓰고 가만 놔두니까 영양공급이 오질 않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앉아서라도 마사지나 안마로 자극을 주세요. 그러
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영양분이 오게 되지요.” 우리 몸은 냉정하게도 활동하지 않는 신체부위에는 에너지 공급을 중단하는 것
이었다. 학생 때 생물시간에 외웠던 용불용설(안 쓰는 신체기관은 퇴화된다는 이론)의 정확함에 무릎을 칠 수밖에.
그러나 사고의 후유증은 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걷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다리근육도 많이 되돌아올 무렵 나타난 후
유증은 자식농사의 이상기후였다. 입원으로 인한 어미의 부재기간이 아이에게는 해방공간이었다. 엄마에게 사후 승인을 받겠
다는 단서를 달고 할머니 대행체제의 틈새를 횡행했다. 가불해 간 용돈은 요상스러운 옷들로 쌓여 있었고 고무줄이 되어버린
귀가 시간과 외출시간은 지저분한 방과 열혈 자유주의자의 불안한 눈빛을 만들어 냈다.
반성은커녕 자신의 개성이라고 합리화하며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사춘기적 저항정신 앞에서 나는 아연했다. 이건 골다공증
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엄청난 공백이었다. 뼈의 공백은 다리를 쓸수록 메워지건만 자식의 공백은 노력할수록 오히려 커져만
갔다. 그 무렵 거실에서 키우던 나무 한 그루가 죽어나갔다. 공교롭게도 그 나무는 재작년에 아이의 생일 선물로 내가 사 준 것
이었다. 제 키보다 더 큰 나무에 감탄하는 아이에게 나는 ‘이 나무가 곧 너라는 생각으로 잘 길러라.’라고 말했었다.
큰 나무가 남긴 거실의 공백은 설쇠고 마을 온 이웃집 할머니의 눈에도 확연했다. 그렇잖아도 쓰린 가슴을 애써 달래던 어머니
가 예의 자위적 발언을 펼치셨다.“오래 전부터 비실비실 하더라고. 갑자기 죽은 게 아니니까 수명이 고만큼 인가 보다 받아들
여야지.” “에이구, 물 많이 줬구먼. 처음 비실거릴 때 물을 딱 끊어서 바짝 말리지 그랬어.” “비실거리니까 물이 모자라 그런가
하고 또 줬지.” “모자라면 지들이 알아서 아껴 쓴다고. 넘칠 때가 문제야. 주체를 못하니까.”
이 말에 내 정신이 버쩍 들었다. 나무가 죽은 원인, 어쩐지 거기에 아이의 공백을 채우는 열쇠가 있을 것만 같다고 여겼던 마음
에 ‘넘칠 때가 문제’라는 말이 꽂힌 것이다. 인생선배들의 말대로 사춘기의 시한부 시대정신일 뿐이라고 애써 믿으면서 그럴수
록 아이에게 관대하게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 왔음을 명료히 깨닫는 순간이었다.
쓰지 않으면 퇴화되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생명의 자연이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지
를 배우게 되었다. 가능하면 몸을 쓰지 않도록 하는 편의주의 시대는 내 몸을 퇴화시키고, 맘만 먹으면 쏟아 부을 수 있는 물질
풍요의 시대는 자식농사를 망친다. 자연을 착취하고 오염시키면서 만들어내는 몸의 안락과 물질적 풍요는 결국은 인간에게 재
앙이 된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불편함과 부족함 속에서 나온다니, 생명체의 신비는 얼마나 엄숙한 것인가.
자료출처 : 서울신문, 2005년 2월 21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